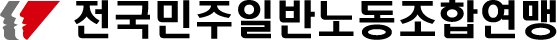[경향신문] 오늘도 환경미화원은 왜 금지된 ‘죽음의 발판’에 오르나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81 조회
- 목록
본문
수거차량 매달렸다가 줄잇는 사고
원칙적으로 탑승 행위는 금지 사항
야간근로·체력부담에 피할수 없는 선택
저상형 청소차 보급은 차일피일
알면서도 반복되는 죽음의 구조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롯가에서 환경미화원 두 명이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투를 날랐다. 두 사람은 한 차례 수거를 마치고 차량 뒤편에 달린 철제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안전모 하나 없이 차량 윗부분의 가느다란 봉만 붙든 이들을 매단 채 수거차가 진동음을 내며 출발했다.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는 동안 발판을 딛고 선 몸들도 위아래로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오른 차량 뒤의 발판은 그간 각종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죽음의 발판’이라 불릴 정도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A씨를 매단 수거차량이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A씨는 그대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이들은 발판에 서 있다가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쳐 사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자들을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올라서고 있다. 우혜림 기자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부착하거나 올라타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를 보면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49조)과 자동차관리법(35조)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매일 위험과 규정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동네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이들은 하루 기본 3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 그만큼 덜 걸을 수 있다. 2018년 환경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지난해 서울시는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몇 대 있는 전동리어카는 충전해도 얼마 못 가고 브레이크가 약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인력이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쪼들리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발판을 없앤다고 해도 일터의 위험은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봇대와 차 사이에 끼일 뻔했다”며 “밤에는 매 순간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사망한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잦은 야간 노동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도 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총 598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망했다. 이 중 39%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가 야간에 일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새벽에 일하다 졸아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잡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의 발이 쓰레기에서 나온 오물에 의한 감염으로 부어 있다. 신재삼 제공
정부도 야간 노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은 야간·새벽이 아닌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낮에 일하면 냄새 등을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낮에 일하면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차가 낮에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다더라”며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 기기도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미화원의 안전을 떠넘기고 사실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외면해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는 “시행령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니 지자체는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과실’이라고 말하면 되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중 일부. 환경부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자가 없으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발판’ 위에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말했다. 13년 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